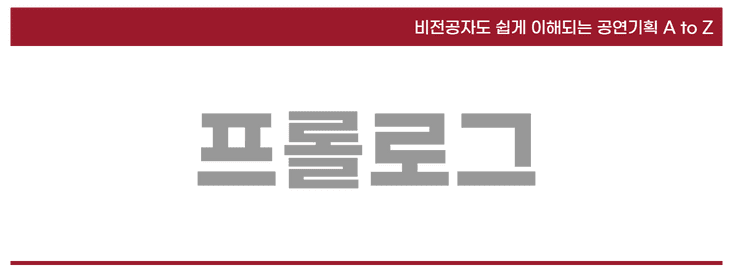
Who am I
20대 후반 늦은 나이에 이 길에 들어섰다. 관련 학과 전공자도 아니요, 이 분야에 아는 사람도 하나 없었다. 차마 “그저 무대가 너무 좋아 내 청춘 다 바쳤다”라곤 말하지 못한다. “다시 내가 여기 발을 딛나 봐!” 하며 차갑게 돌아선 적이 여러 번이다. 하지만 이내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다. 어느덧 ‘꼰대’라는 나이에도.
학창 시절 무대 위 주인공을 꿈꿨다. 태어나 처음으로 무언가 되고 싶었다. 꼬마 시절 교회 다니는 큰 즐거움 중 하나는 노래와 율동. 특히 매년 크리스마스 즈음 준비하는 성탄 행사가 그리 신날 수 없었다. 관종 끼가 있었나 보다. 그중 ‘성극’은 성탄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다. 주인공은 한 번도 못했지만 대사 한 마디라도 좋았다. 아쉽게도 그 마음이 재능을 보장하진 않았다. 무대에서 “또요?”라는 대사를 “똥이요?”라 뱉었다. 유일했던 그 대사 하나를.
고2 때 ‘촌극 대회’ 연출을 맡고 수험생이 되면서 연극영화과에 가기로 결심했다. ‘연기도 하고, 연출도 해야겠다, 두 개 다 소화해 멋지게 살아야지!’라는 마음으로. 바로 벽에 부딪혔다. 그림을 전공하는 언니에 이어, 두 딸을 다 예술쟁이로 만들 순 없다나. 나름 우등생이었던 내게 부모님의 기대는 높았고 담임 선생님도 말리셨다. ‘그래? 그럼 성적이 좀 떨어지면 원하는 걸 시켜 주시겠지!’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성적만 곤두박질.
점수에 맞춰 간 학교에는 관심이 없었다. ‘신문방송학과 나온다고 다 방송국 PD되나?’ 다 남일이었다. ‘이대로 졸업하면 나는 뭐가 될까’ 마음 속 고민이 깊어지다 마지막 학기를 남기고 캐나다로 향했다.
어학연수는 핑계였다. 그저 시간을 벌고 싶었다. 또 다른 내 꿈을 찾아야만 했다. 부모님과 갈등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남들만큼 돈도 벌고 나름 즐기며 살 수 있는 그 무엇을. 하지만 넓은 세상은 내게 말했다. "가슴 뛰는 일을 해야 해, 그게 진정한 행복이야!" 마음을 잡지 못 한 나는 졸업 후, 2년을 더 방황했다. 돈이 궁해져 뭐라도 해야 했기에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그리고 1년 후, 결국 대학로에 입성! … 매일 화장실 청소를 했다. 제기랄!
계기는 이렇다. 애써 공연을 안 보던 시절이었다. 내 안에 여전히 살아 있을 무대에 대한 갈망을 자극할까 두렵던 그때. 그날은 웬일인지 ‘삘’을 받았나 보다. 낯선 공연이 하나 눈에 들어왔다. 넌버벌퍼포먼스(무언극). 대사가 없단다.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온갖 무술을 해가며 날고뛴다 했다. 관객들 평도 하나같이 좋았다.
무작정 두 장을 예매했다. 가장 한가한 친구 한 녀석을 불렀다. 배 아프게 웃고 즐기다 보니 커튼콜이었다. 집에 오는 내내 쉴 새 없이 떠들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봤어? 완전히 날아다니던데?" "저 사람들 뭐야, 배우야? 스턴트맨이야?" "진짜 대박이다!" 누가 봐도 몹시 흥분 상태. 내가 그랬다.
실로 오랜만에 가슴이 뛰었다. 그 후 나는 빠르게 움직였다. ‘이제라도 시작하자. 무대 위 주인공이 아니면 어때. 그 무대를 만드는 한 사람이 되자!’
넘어야 할 산이 있었다. 공연계 취업은 인맥이 반이란다. 전공자도 아니요, 사돈의 팔촌을 엮어도 답이 없었다. 그러다 찾은 SBS 방송아카데미 문화연출학부. 공연 기획 과정이 있었다. ‘좋아! 그 인맥 돈으로 사자. 어떻게 해서든 강사들 눈에 띄자.’ 내 목적은 단 하나. 수업도 열심히 참석하고 뒷풀이도 빠지지 않았다. 6개월 과정을 최우수로 수료했다.
출강하시던 콘서트 회사 실장님 한 분이 인턴을 제안하셨다. 여름 성수기 한정 계약. 야외 콘서트와 어린이 연극이 진행되는 동안 "시키는 거" 다 했다. 공연장에서 우연히 뵌 타 기획사 대표님이 물으셨다. 이다음엔 뭐 할 거냐고. 어린이 체험극을 하나 준비 중인데 배우가 부족하단다. 프로필 촬영을 하고, 두 달간 배우로 살았다. 이후 기획사 정식 채용 공고에 이력서를 냈다. 나이 제한에 걸렸으나 개의치 않았다. “Give Me A Chance!” 자기소개서 맨 위에 크게 적고 나를 강하게 어필했다.
2004년 10월 5일. 대학로 사무실로 첫 출근. 정확히 1년 전 온몸을 전율케 한 그 작품에 합류했다. 프로덕션 매니저. 그게 나의 포지션. ‘난 오늘부터 제작팀이다!’ 저녁에는 하우스 업무도 겸했다. 현 세종 M 시어터의 전식 격인 당시 세종 퍼포먼스홀엔 하우스 인력이 없었다. 공연장 운영 인력을 별도로 꾸려 하우스 매니저 역할을 했다. 청소 용역도 없었다. 오후 4시면 극장으로 넘어가 안내원 친구들과 함께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했다. 로비를 쓸고 닦았다. 매직 블록이 내 손을 떠나지 않았다. 6개월 동안.
20대 끝자락의 내 열정은 그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 최대한 쾌적한 환경에서 관객들을 맞이하자!’ 애써 내 육체적 노동에 의미를 부여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 했다. 다들 “수고한다” 말했다. 직접 나서 도와주진 않았다. 아르바이트생 급여까지 밀리기 시작했다. 청소까지 시켜 볼 낯도 없는데. 공연이 끝나면 치킨을 샀다. 미안하니 배라도 채워주고 싶었다. 내 카드 값도 밀리고 있었지만.
퇴근 후의 삶이란 기대할 수 없었다. 공격적인 지방 투어와 해외 마케팅으로 작품의 인지도가 쌓여가니 공연이 동시다발 이뤄지고 내 업무도 늘었다. 연습 배우 관리도 내 몫이었다. 학생 단체 공연도 많았다. 아침 공연은 배우와 스태프 모두에게 최악이다. 새벽녘에 별을 보며 집을 나서 김밥 수십 줄을 사 들고 공연장으로 향했다. 집에선 잠만 자는 하숙생, 극장에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시. 다. 바. 리. 서글펐지만 티 내지 않았다. 매 순간 최선을 다했고 진심을 담았다.
콘서트와 어린이 체험극, 넌버벌 퍼포먼스,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를 두루 경험했다. 제작팀 업무에 굳은살이 베길 때쯤 기획팀을 맡았고 홍보팀도 거쳤다. 이제는 하나의 작품을 총괄하기에 이른다. 새로운 소재를 찾아 나서고 작품 개발하는 시간도 즐겁다. 다양한 업무 경험은 내게 큰 재산이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이다. 믿고 따르고 싶은 사수, 단 한 번을 못 만난 불운아다. 덕분에 조금 느리지만, 그래도 꾸준히 성장했다. 그리고 … 사람을 얻었다.
무대 위의 삶은 누가 보아도 근사하다. 빛이 난다. 그 무대를 준비하는 이들은…결코 녹록치 않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해라! 진심으로 그리 말하고 싶다. 이곳에 열정을 쏟아내고 싶은 이들에게 굳이 이 길을 꼭 가야만 하겠냐고 한번은 다시 묻고 싶다. 관객일 때, 제일 행복하다. 그러니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 데일 듯한 청춘의 그 뜨거움, 왜 하필 이곳이냐. 다른 데라면 몇 배는 더 보상받을 거다. 충분히 값지게.
이 책은 단순히 어떤 방식으로 공연이 만들어지는 지에 대해 알려주고자 함이 아니다. 막연하게 상상하는 그 작은 세상, 실무 이해를 통해 그곳이 어떤 곳인지, 내가 바라던 세상인지, 내가 잘 적응하고 감당할 수 있을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길 원한다. 열정을 품고 시작해 상처만 가득 안고 돌아선 이들 많다. 그러니 당신은 부디 후회 없는 선택을 하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길을 고집한다면, ‘다정한 선배’를 필요로 하는 바로 그때, 곁에 있어주는 한 사람이 기꺼이 되어 주고 싶다. 이 책을 쓰는 이유다.
